무라카미 하루키
그의 글을 처음 읽은 건 스무 살이 되던 해였던 걸로 기억한다.
집에 꽂혀 있던 <상실의 시대>라는 제목의 책이었다.
그 책의 원제가 <노르웨이의 숲>이라는 걸 알게 된 건 그 후로 꽤 긴 시간이 지난 후였다.
아무튼 나는 상실의 시대를 엄청 지루해하면서, 그래도 읽기 시작했으니 끝까지 읽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꾸역꾸역 읽었던 기억이 난다. 책의 내용은 다 잊어버렸다. 단지, 내가 억지로 끝까지 읽었다는 것만 기억에 남아있다.
그래서였을까. 나는 하루키의 책을 그 뒤로 읽지 않았다.
첫인상이 그닥 좋지 않았기 때문이겠지.
(만약 상실의 시대를 재미있게 읽었다면, 그 후로도 계속해서 많은 책을 읽었겠지만 말이다)

다시 하루키의 글을 읽게 된 건, 스물 다섯살 즈음이었던가.
누군가 내게 <중국행 슬로보트>라는 하루키의 단편소설을 이야기해 준 것이 계기가 되었다.
나는 중국행 슬로보트를 읽고 영화 <중경삼림>을 떠올렸었다.
전혀 다른 내용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분위기가 닮았다고나 할까?
그 당시 나는 그런 분위기가 좋았다.
쓸쓸하지만 쓸쓸하지 않은.
중국행 슬로보트를 시작으로 하루키의 단편 소설을 여러 편 읽었다.
나는 그의 짧은 이야기들이 좋았다.

하루키의 긴 이야기를 다시 읽게 된 건 서른 즈음.
<해변의 카프카>, 나에게 '생령'에 대해 알려 준 소설
그 '생령'이라는 모티브가 너무나도 강렬해서, 그 뿌리가 되는 <겐지 모노 가타리>까지 읽게 만들었던 소설, 해변의 카프카.
(하지만 겐지모노 가타리는 만화로 읽었는데도 어렵기만 했다)
그리고 정말 단숨에 읽어 내려간 1Q84까지.
나는 스무살에 처음 하루키를 만나, 30대를 지나며 그를 좋아하게 되었다.

그리고 오랜시간 잊고 지내던 그와 그의 글들을 다시 만났다.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 이 소설을 나는 왜 이제야 읽었을까?
어째서 나는 이 소설을 읽었다고 착각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왜 이제야 그의 긴 이야기들이 좋아지는 걸까?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에는 주인공의 친구인 '쥐'가 나온다.
쥐는 지독히도 책을 읽지 않는다. 그가 스포츠 신문과 광고지 이외의 활자를 읽는 걸 본 적이 없다.
내가 이따금 심심풀이로 읽는 책을 쥐는 언제나 파리가 파리채를 바라보는 것처럼 신기하다는 듯이 들여다보았다. -P.23
그런 그가 소설을 쓴다.
쥐의 소설에는 뛰어난 점이 두 가지 있다. 우선 섹스 장면이 없다는 것과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람은 가만 내버려둬도 죽기도 하고 여자와 자기도 한다. 그런 법이다. -p.28

나는 소설속의 쥐가 좋아졌다.
늘 궁금했기 때문이다.
왜 항상 소설속엔 섹스 장면이 나오는 걸까?
왜 그런 표현은 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걸까? 하는 의문들.
그런 게 꼭 필요한 걸까? 하는 의심들.
그런데 쥐의 소설에는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
나는 쥐가 쓰는 소설을 읽고 싶었다.
쥐가 쓴다는 그런 소설을 쓰고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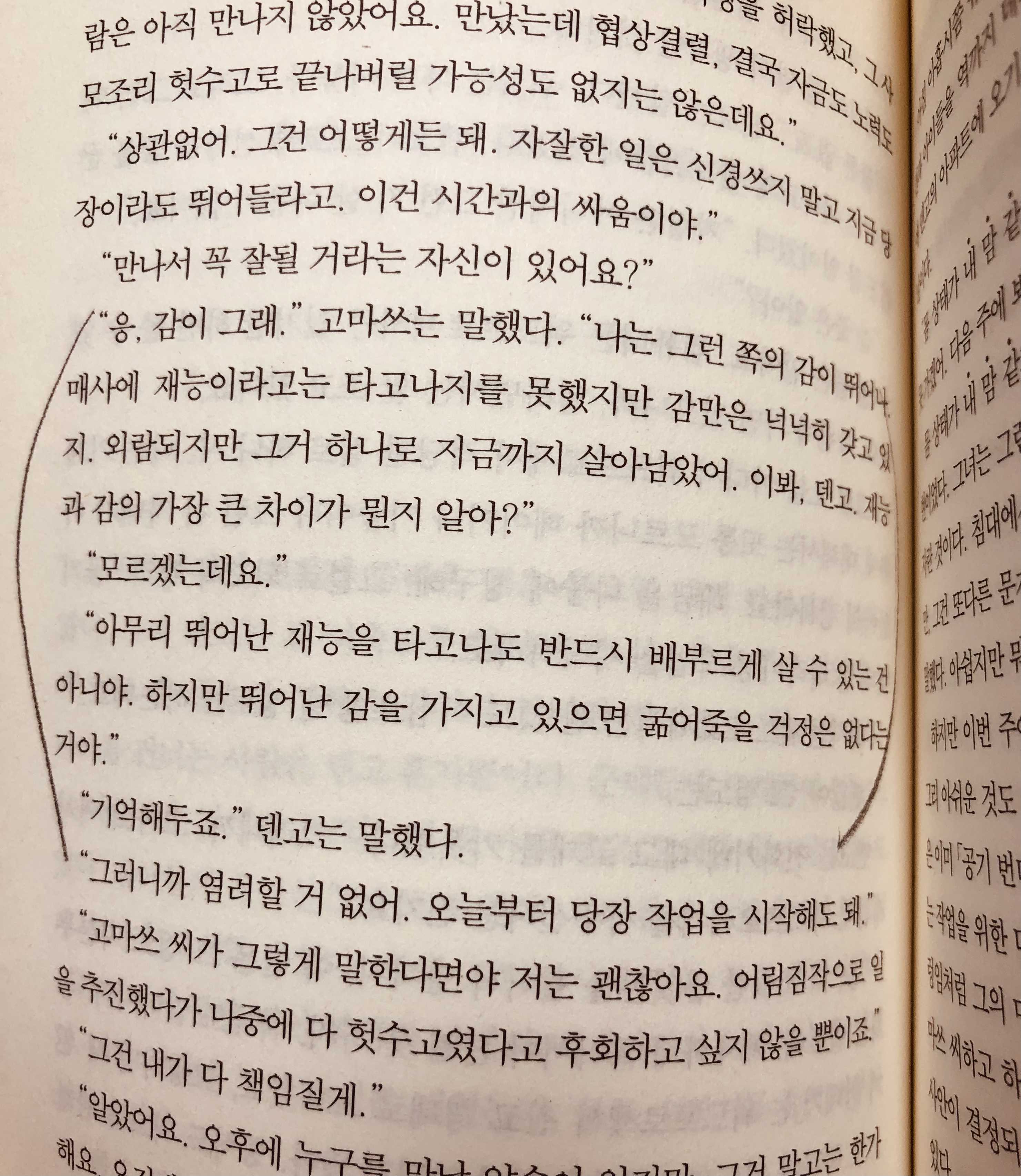
모두가 잠든 새벽 세 시에 부엌의 냉장고를 뒤지는 사람은 이 정도의 글밖에는 쓸 수 없다.
그게 바로 나다. -p.15
하지만 나는 이정도의 글도 쓸 수 없는 인간이다.
다시 하루키의 글을 읽고 싶다.

'지극히 사적인 >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아이가 만든 <우리 가족 조사책> (0) | 2021.06.06 |
|---|---|
| 글쓰기의 고단함 <뼛속까지 내려가서 써라> (0) | 2021.06.06 |
| 반짝 반짝 빛나는, 에쿠니 가오리 (0) | 2021.06.02 |
| 5월, 봄날의 경주 여행 <경주 황리단길> (0) | 2021.05.30 |
| 하기와라 사쿠타로 단편선 <고양이 마을> (0) | 2021.05.29 |



